| 제목 | [네팔] 안나푸르나 산으로 가는 길 |
|---|---|
| 작성자 | 안*영 |
| 작성일 | 2019.12.27 |
|
산으로 가는 길
글/사진 안준영_혜초여행 트레킹1사업부
히말라야, 그 뜻은 ‘눈의 거처’라고 알려져 있다. 이미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가이드에게 히말라야의 뜻을 물어보았다. “히말”은 네팔 말로 “산”, “라야”는 “~이 있는 곳”, “~로 가는 길”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 즉, 히말라야는 ‘산으로 가는 길’이며, 그 자체로 ‘산’이다.
안나푸르나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안나’는 음식이라는 뜻이며, 푸르나는 ‘무한하다’는 뜻이다. 강가푸르나의 강가는 ‘순수’라는 뜻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저 네팔 사람들이 생각하는 히말라야를 알고 싶었다. 거대한 산을 아무렇지 않게 곁에 두고 사는 네팔 사람들의 산을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트레킹보다도 힘든 카트만두에서 나야풀 마을까지의 여정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7시간, 카트만두에서 하룻밤 자고 국내선 비행기 타고 포카라까지 1시간, 포카라에서 버스 타고 안나푸르나의 들머리 나야풀 마을까지 2시간이다. 본격적인 트레킹 시작점까지는 다시 지프차로 환승해서 한 시간을 더 가야 한다. 더 이상 바퀴 있는 탈 것이 가지 못하는 곳, 마큐. 마큐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 포카라 공항에 내리면 마차푸차레가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다.
대한항공편을 이용한 네팔 카트만두 직항은 7박 9일의 여정 중 우리가 타는 교통편 중 가장 으뜸이다. 그 다음은 카트만두와 포카라를 잇는 국내선 항공이다. 육로를 이용한 교통편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쉽지가 않다. 네팔의 교통 사정이 여느 나라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카트만두나 포카라 시내 정도는 그래도 포장도로가 잘 돼 있는 편이지만, 나야풀로 가는 길 중간중간에는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 버스를 타고 나야풀로 가는 길에서 보이는 마차푸차레. 마차푸차레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안내자와 같다.
‘신작로’라는 딱 들어맞는 말이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는 차들 때문에 나무들은 흙먼지를 뒤집어써 제 빛을 잃고 희뿌옇기만 했다. 차창 밖으로는 돌을 나르는 공사 인부들, 왠만한 장정도 들기 힘들 것 같은 땔감을 짊어 맨 네팔의 어느 여성. 산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여행자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네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
▲ 도로변에 건물을 짓고는 있는 사람들.
먼지 풀풀 나는, 나야풀 ~ 마큐 오프로드 구간을 거쳐 마큐 ~ 지누단다까지 가벼운 산책
▲ 나야풀에서 버스에서 내려 지프 차량으로 환승한다.
포카라에서 나야풀까지의 거리는 약 40킬로미터, 2시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라면 30분이며 가는 거리이며, 시속80킬로미터의 국도였어도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이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취한 듯이 타고 오면 나야풀에서 사람과 짐을 내려준다. 버스와 지프 환승장 역할도 하는 나야풀의 상점가에서 카고백을 내리고, 지프에 싣고 사람들을 태우는 준비를 한다. 그곳에서 준비를 기다리며 간간히 현지 버스들도 오고 간다.
“포카라 포카라 자누스.”
버스에서는 안내원이 내려서 포카라 가는 버스라고 외치면 버스를 기다리던 네팔 사람들과 가이드도 포터도 없이 트레킹을 하는 덩치 좋은 서양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도 한다. 태울 사람을 태우고, 내릴 사람을 내리고 버스는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포카라로 떠난다. 반대로 우리는 지프를 타고 비레탄티를 지나서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에 오른다. 길은 굽이지고, 파여 있고, 그 위를 달리는 지프 차량 속에서 우리는 염치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헤드뱅잉을 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종잇장 한 장 차이로 비껴가는 네팔의 베스트 드라이버들에게 무한한 경의와 존경, 안도, 감사함을 표하다가 비로서 마큐에 도착해서 큰 숨을 내쉰다.
▲ 지누단다 롯지에서 보이는 안나푸르나 남봉(왼쪽)과 히운출리(오른쪽 나무 뒤로)
트레킹 첫 날은 마큐에서부터 지누단다까지,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이다. 이 날은 트레킹은 어렵지 않고, 마큐까지만 무사히 오면 그날의 일정은 90%는 끝난 것이다. 지누단다까지는 설렁설렁 걸으며, 히말라야의 미봉 마차푸차레와 그 옆으로 펼쳐지는 히운출리, 안나푸르나 남동 등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며 걷다보면 어느새 지누단다 롯지에 닿는다.
트레킹2일차. 지누단다 ~ 도반
트레킹 일정이라는 게 어쩌면 아주 신나는 건 아닐지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저녁 먹고 잔다. 다시 아침 오면 어제 했던 것처럼 먹고, 걷고, 먹고 또 걷는다. 트레킹 2일차는 지누단다에서 출발해서 도반까지 가야한다. 해발고도는 지누단다 1780m, 도반 2505m. 지누단다의 고도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산행을 해온 사람이라면 경험해봤을 고도이지만 도반의 고도는 해외 트레킹이 처음인 사람이라면 처음 맞이하는 고도일 것이다.
▲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하다보면 도중에 말을 종종 만나게 된다.
머메리즘의 창시자 알버트 머메리의 말처럼 ‘문제는 고도(Altitude)가 아니라 태도(Attitude)다’. 물론 우리가 가는 최고 고도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4130m로, 안나푸르나의 고도 8091m, 그 반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최고의 산악인처럼 다짐하는 게 좋다.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은 아름다우면서도 아름다운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트레킹을 나서는 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메인 가이드 파상 셰르파를 선두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로 향한 그 첫걸음을 떼는, 상쾌한 아침이다.
▲ 촘롱 마을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풍경.
▲ 촘롱 마을 올라가는 길.
지누단다에서 시누와까지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구간이다. 촘롱까지는 오르막길이지만, 이후 시누와를 가기 위해서 고도를 쭈욱 내렸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 촘롱 롯지에서의 여유로웠던 티 타임, 즐거운 담소와 얼굴들은 시누와로 오르는 오르막길에서 좀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묵묵히 오르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힘겨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종 보이는 저 봉우리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던 질문들도 지금 이 순간에는 보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듯 오르기만 한다.
시누와에서 꿀 같은 점심 밥을 먹고 다시 걷는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밤부를 거쳐서 도반에 도착했다. 고개를 드는 마차푸차레의 물고기 꼬리가 붉게 물들어 있다.
▲ 붉은 '물고기 꼬리(마차푸차레)'
트레킹 3일차. 도반 ~ 데우랄리 ~ MBC(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
도반부터 데우랄리 구간은 ‘마르디콜라’라는 깊은 계곡을 끼고 걷는다. 계곡이 깊어서 오전 시간대에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걷는 중에도 체온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춥지 않을 정도로 따듯하게 라는 애매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레이어링 시스템’, “덥기 전에 벗고, 춥기 전에 입고, 배고프기 전에 먹고, 목 마르기 전에 마셔라”라는 등산의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좀처럼 햇볕이 들지 않는 마르디콜라.
2500m가 넘는 고도에서의 하룻밤은 생각보다 쉽게 잠들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고도에 대한 반응은 수면 중에 더 예민해진다. 높은 고도에서의 잠자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날 트레킹을 계속하다보면 체력이 소진되고, 이때에 고소증세가 쉽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혜초여행에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간다는 원칙으로 입맛에 잘 맞는 한식을 준비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준비하고자 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잘 가는 것은 각자의 역량이지만, 노련한 트레킹 가이드들이 트레킹 구간마다 적절한 휴식 포인트,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어가며 트레킹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
▲ 고도가 3000m를 넘어서야 양지 바른 구간이다.
3200m의 데우랄리에 도착하니, 파상 셰르파 가이드가 “쉬는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라고 알려준다. 3000m가 넘는 곳에서부터는 네팔 사람들도 고소 증세를 느끼는 고도이니 한국 손님들은 더욱 조심하라고 덧붙인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키 큰 나무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조금은 더 황량한 느낌의 산이 되었다. 고도를 올리는 산행은 묘한 매력이 있다. 시나브로 고도를 올리면서 달라지는 식생, 기온, 변덕스러운 날씨 등의 영향으로 트레커로 하여금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한편으로는 그 긴장감이 가슴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히말라야를 찾는 것이 아닐까.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트레킹 중 비교적 쉬운 편인 코스이기 때문에 히말라야를 처음 찾는 트레커들이 많이 온다. 즉,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로 가는 길’인 것이다. 데우랄리에서부터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차푸차레가 성큼성큼 내게 다가오는 것 같다. 어쩌면 이 트레킹 여행은 안나푸르나로 가는 길이 아닌, 마차푸차레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차푸차레를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
오후 4시가 넘으니 차가운 산바람이 내려온다. 서늘해지는 공기에 조바심을 내서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로 걸음을 재촉한다.
▲ 차가운 산바람과 따스한 골바람이 만나면서 바로 안개가 끼어 버리는, 히말라야의 거친 날씨.
트레킹4일차. MBC ~ ABC
새벽 3시, 혜초 트레킹 스태프들이 여느 때부터 일찍 문을 두드린다.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배낭을 꾸린다. 전 날 밤,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준비할 것은 없지만 헤드램프를 잘 챙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매섭게 뺨을 스치는 밤바람에 소스라친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곤욕인 추위에 올려다 본 히말라야의 밤하늘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지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하늘엔 구름이 없고, 보름달 빛이 히말라야 봉우리마다 걸려 있었다. 달빛을 받은 설사면이 히말라야를 빛나게 한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빛나고,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은 눈도 얹혀 있지 못하는 산의 절벽에 있었다.
발밑을 밝히는 헤드램프보다는, 어슴푸레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운출리, 마차푸차레를 밝히는 달빛을 등에 매고 어두운 길을 밝게 걷는다.
▲ MBC에서의 밤 |
|
| 이전글 | 남아프리카 5국 일주 12일 여행소식! |
|---|---|
| 다음글 | [중국] 천하제일경! 황산/삼청산/무이산 트레킹 |



 전체 메뉴
전체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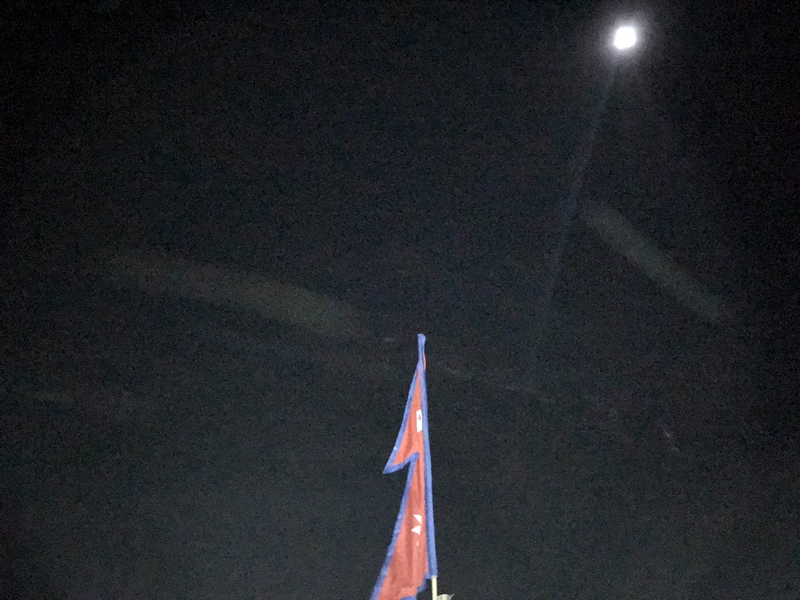
 목록
목록